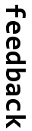우리 동네에는 작은 까페가 있다.
우리 동네에는 여러 개의 아파트가 모여있다.
우리 동네 아파트의 이름은 전부 같다. 아파트는 우선 차수를 달리함으로써 한 번 구분이 되고 다른 동네가 그렇듯 동수를 달리함으로써 두 번 구분이 된다.
우리 동네 작은 까페는 아파트 단지 사 차와 육 차의 경계에 위치한다. 동네의 작은 까페인데도 커피 값은 비싸다. 나는 자주 그 곳에 가서 비싼 커피를 마신다.
어떤 문장을 써도 부족할 것이다. 그냥 그런 곳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.
여름의 햇살이 가을의 바람에 실려오는 오후에, 그 까페에서 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.
K가 죽었단다. 알고 있었니.
친구는 여보세요, 라던가 나 누구야, 같은 말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K라는 이름을 꺼냈다. 내가 몰랐을 것을 이미 안다는 듯한 어조였다. 나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잠시 멍해졌다. 그렇지만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.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, 사실 나는 K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떠올릴 수 없었다.
그러다 문득 어떤 그림자가 떠올랐다. 길고 강마른 그림자. 기흉을 앓았던 그 애 그림자의 가슴팍에 나는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늘 구멍을 그려넣곤 했다. 그 일을 몇 번 반복하자 정말 원래부터 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. 그 그림자의 이름이 K였었지. 나는 K, K하고 그 이름을 입에서 굴려보았다.
그 K구나.
늦
나는 자주 그림자를 의식했다.
처음에는 안녕이라고 말했던가. 그저 등을 툭 쳤던 것도 같다. 어쩌면 아무 말 없이 발맞춰 걷는 데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. 희미하게 부유하는 기억 속에서 돌올하게 돋아있는 것은 여전히 가로등을 등진 그 애의 그림자뿐이다. 아무래도 좋다. 어느 순간 K는 스쿨버스에서 내려 독서실까지 걸어가는 그 밤마다 내 옆에 있었다.
처음에 K는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. 나는 K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다. 이웃에 살고 있었지만 아파트의 차수가 달랐으므로, 우리는 각자를 각자의 차수로 칭했다. 나는 K에게 육 차였고 K는 나에게 사 차였다.
K를 밤에만 만난 것은 아니었다. 우리는 밤의 친구였다.